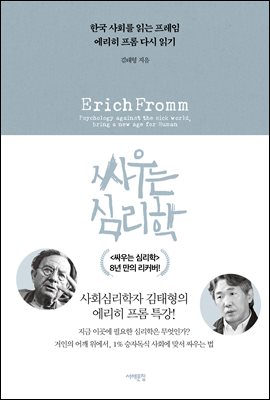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 저자
- 전혜원 저
- 출판사
- 서해문집
- 출판일
- 2021-12-11
- 등록일
- 2023-03-15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40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노동 :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나 화폐를 얻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우리는 모두 노동자다. 사전이 그리 정의할뿐더러 현실에서도 그렇다. 오늘날 자본주의 세계에서 ‘사람의 가치’는 그가 가진 ‘노동의 가치’와 연동된다.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좌우하는 것은 개인의 노동에 매겨지는 가치(임금)다. 값비싼 노동자일수록 촉망받는 인재로, 각광받는 결혼 상대자로, 존경받는 부모로 살아가기 쉽다. 반면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저임금 노동자, 나아가 실업자는 최소한의 권리와 존엄조차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이 책은 노동력을 사람의 가치로 환산하는 오래된 현실이 합당한지에 대해 애써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은 너무 크고 머나먼 차원의 일이다. 대신에, 좋든 싫든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과 일터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에 주목한다. 요컨대 이 책은 플랫폼 노동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 시대를 압축해 보여주는 9가지 질문으로 엮어낸 ‘밀레니얼 한국의 노동여지도’다.자신의 이주 노동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저자는, 모두가 노동자인 사회에서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노동법의 보편적 보호망이 왜 어떤 노동자에게는 미치지 않는지를 묻는다. 내가 하는 노동이 다른 이의 노동과 같을 때 적용되어야 할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묻는다. 수년째 ‘공정’을 명분으로 벌어지고 있는, 들어갈 자격(공채 정규직)과 일할 자격(숙련된 비정규직)의 다툼에 숨은 차별의 구조를 묻는다. 쿠팡과 타다 등 신산업의 총아들이 뽐내는 ‘혁신’이 실은 ‘약탈’의 다른 이름이 아닌지 묻는다. 기술이 일자리를 잠식하며 숙련공들을 노동시장 밖으로 내몰 때, 공동체가 지녀야 할 태도와 처신에 관해 묻는다. 왜 우리는 일터에서 날마다 명복을 빌어야 하는지 묻는다. 그 죽음들을 멈추기 위해 만들어진 법과 제도의 공과를 묻고 또 묻는다. 질문을 던지는 이는 저널리스트 이력의 과반을 노동 현장에서 채워온 1988년생 시사주간지 기자다. 그는 반(反)신자유주의나 시장주의 같은 거대하고 추상적인 관념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선악의 이분법을 따르지도 않는다. 두 눈과 두 발로 겪어온 취재현장이 그에게 ‘노동은 결코 신성하지 않으며, 노동 문제는 이해를 달리하는 행위자들 간 합리적·비합리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거대담론을 뒤로한 채 개별 노동자와 조직 노동, 기업과 정부, 해묵은 관행들과 제도의 역학을 파고든다. 언뜻 무관해 보이는 이 복잡다단한 현상들은 ‘숙련의 해체’라는 공통분모 위에서 ‘일목요연한 한국 노동의 풍경’으로 재구성된다. 저자와 이렇다 할 인연이 없음에도 이 책에 치밀한 비평과 질정을 건넨 소설가 김훈은 그러한 문제의식이 “‘정의란 무엇인가?’라기보다는 ‘무엇이 정의인가?’에 가깝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이 책은 ‘이념의 깃발로 펄럭이지 않으며, 질문이 추구하는 정의는 실용적이며 생활적이다. 이 책의 질문들은 가치중립적이되, 탈가치가 아니라 충돌하는 여러 가치들을 함축하는 넓은 시야를 가졌다. 이를 통해 원리가 아니라 방법으로서,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작동되는 정의의 모습을 힘겹게 그려내고 있다.’ 소멸하는 일자리에 대한 치열한 관찰과 모색이라는 점에서 이 책은 한 세대 전의 고전 《노동의 종말》(1996)을 잇고 있다. 그 숙련 해체를 주도해온 기술 혁신의 은밀한 착취 구조를 고발한다는 점에서는 《영국 노동계급의 형성》(1963)의 통찰을 닮았다. 일터에서 모멸받고 쫓겨나는 이들의 인간적 상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난쏘공》(1978)이나 《전태일 평전》(1983)의 리부트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이 책은 불세출의 경제학자 알프레드 마셜이 한 세기 전 당부한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심장’으로 써내려간 이야기다. 소설가 김훈이 이 책에 붙인 추천사의 마지막은 이렇다.“선악의 구분을 넘어서려고 했다지만, 결국 그도 가치판단을 완전히 내려놓지는 못한다. 인간이, 사회적 관계를 설정하는 일은 윤리의 범주를 저버릴 수 없다는 것을 전혜원 기자는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