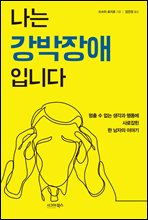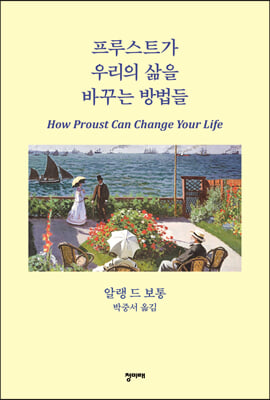상세정보

미안해 너를 잊어서
- 저자
- 이지형 저
- 출판사
- e퍼플
- 출판일
- 2024-05-03
- 등록일
- 2024-06-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54M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나"는 태어날 때부터 두 세계에 동시에 속해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어릴 적부터 "나"를 찾아오던, 그리고 내가 찾아가곤 했던, 언제나 나와 함께였으나 나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느껴지지도 인식되지도 않는 세계와 그곳에 속한 자들의 이야기이다.
존재인지 비존재인지 알 수 없던 그들과의 교류와 그들의 이야기들이기도 하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용기가 생겨서 그 이야기들을 기억해 줄 수 있을 그 날을 위해 오래 전의 "나"는 그들과의 만남의 순간들을 숨죽이고 적어 놓았던 것일까?
"나"는 말한다.
어릴 때는 그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기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서 드러내지 않았고, 젊을 때는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다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존재와 그들과 나의 이야기들을 드러내고 싶다고.
이제 "나"는 더는 어리지도 젊지도 않다. 그리고 어리지도 젊지도 않다는 건 꽤 좋은 일이다.
인정받고 그럴듯한 것이 아니어도 눈치 보지 않고 드러낼 수 있게 되었고, 안다면 해결해야 한다는 부채감과 해결하지 못했을 때의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뻔뻔함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나"가 소리내서 말하고 싶은 건, 괴이해 보이는 이들 미지의 대상이 사실은 내 안의 "다른 나"들이고, 나의 변형된 얼굴들임을 알아버렸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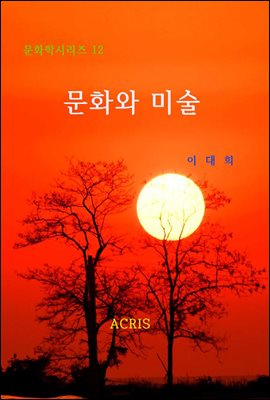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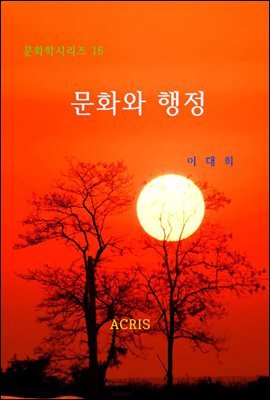

![[단독] 그들은 바다에서 왔다](/images/bookimg/L_187323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