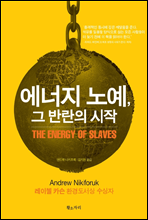가시리
- 저자
- 선유
- 출판사
- 황소자리
- 출판일
- 2017-12-27
- 등록일
- 2018-02-1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750년 전 이야기예요. 백 년도 못 사는 인간에겐 먼 옛날이지요. 대부분은 파괴되고 잊혔습니다.
그러나 높고 고운 노래 몇몇이 남아, 그 시절의 벅찬 만남과 쓰라린 이별을 들려줍니다.
천 년 전이든 만 년 전이든, 인간은 사랑하기 위해,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지구별에 태어났지요.
―‘작가의 말’ 중에서
사랑노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는 모두 사랑노래다.
삶이 참혹할수록 노래는 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빛난다고 했다. 750년 전, 그들의 노래 또한 그러했다. 많은 것들이 시간의 무자비한 파괴력 앞에서 잊히고 묻히고 흩어졌지만, 그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 몇몇은 살아남아 우리 곁에 닿았다. 학창시절, 우리는 ‘높고 고운 노래[高麗歌謠]’라는 이름으로 그 별곡들의 가사를 읊조리고 외웠다.
선유 장편소설 《가시리》는 바로 그 노래, 우리가 흔히 ‘고려가요’라 부르는 별곡의 주인들을 새롭게 호출해 목소리와 숨결과 생각과 눈빛을 불어넣은 사랑노래다. 작가 선유는 자료와 상상을 질료 삼아 결코 간단치 않았을 그들의 이야기를 손에 잡힐 듯 서늘하고 아릿한 풍경으로 우리 앞에 펼쳐놓는다.
1270년 4월 마지막 날 아비 고음(考音)의 장례를 치른 아청(鴉靑)은 보름 동안 말문을 닫았다. 당대 최고 거문고 연주자이자 별곡 작곡자인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서재에 들어설 때만 해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하루 동안 서재를 정리한 후 방상(고려시대 악사들이 소속되어 있던 기관) 연습실로 가서 별곡 몇 자락에 슬픔을 털어내면 될 거라 믿었다. 팔방상의 으뜸 가인(歌人) 아청을 아끼는 사람들은 그녀의 침묵을 슬픔의 밀도와 연결시켰다. 그 낡은 틀에 갇히지 않고 아청을 찾아온 이는 두 사내뿐이었다. 좌(左)와 우(右). 삼별초에 속한 무인이자 아청의 오랜 벗이었다. 셋은 강화경에서 태어났다. 부모의 고향은 서경이지만, 왕국(고려)이 북쪽 제국(몽골)에 맞서 강화로 도읍을 옮긴 이후 부모도 그 자식들도 노래(〈서경별곡〉)로만 고향 땅을 그리워했다. 그 시간이 무려 38년이었다.
새롭게 살아 돌아온 750년 전 노래의 주인공!
꼭 셋일 필요는 없으나, 아청이 포함될 때 그들은 늘 셋이었다. 셋에서 둘이 되고, 둘에서 하나가 될 날이 멀지 않음을 예감하면서도, 셋은 애써 그 예감을 외면했다. 한 사람을 얻음으로 한 사람을 잃는 길을 가기에는 셋이 쌓아올린 탑이 너무나 견고하고 완전했으므로. 선택의 날은 뜻하지 않은 방식으로 왔다. 왕이 몸소 제국의 수도에 가서 황제 앞에 엎드려 그들의 속국이 되기를 간청한 것이다. 길고긴 날들을 버티며 전쟁을 이어갔지만 제국은 압도적으로 강했다. 좌와 우가 서로 다른 시간에 아청을 찾아왔다. 두 벗 다 제국이 지닌 무소불위의 힘을 인정했으나 미래를 향한 의지와 희망의 길이 달랐다. 그러므로 우는 왕과 대신들의 뜻을 따라야 한다 말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는 저항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지금껏 좌와 우의 의견이 갈릴 때 아청은 두 사내 모두 섭섭해 하지 않는 절충안을 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절충할 지점이 보이지 않았다. 두 벗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서로 다른 미래를 바라보며 좌와 우가 치러냈을 숱한 고뇌와 불면의 밤들이 손에 잡힐 듯 선명하게 그려졌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자신이 개입할 틈이 없었다. 결코 하나로 모을 수 없는 희망이었다. 아득한 갈림길 앞에서 아청의 가슴은 미어졌다. -35쪽
의지가 또한 사랑인 여인, 사랑이 또한 의지인 사내
번개처럼 빠르고 당당한 청년 우는 확신했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 둘이 남아야 하는 날에 아청은 결국 자신의 여인이 되리라고. 고통은 없고 기쁨만 들꽃처럼 피어오르던 시절, 우의 사랑은 열 살 초봄에 시작되었다. 눈이 녹지 않은 산길을 걸어 온통 붉게 피어오른 진달래를 꺾기 위해 좌와 함께 절벽을 올랐던 그 날, 절벽 아래 선 아청이 진달래꽃보다 고운 목소리로 ‘가시리 가시렵니까 버리고 가시렵니까…,’ 새로 배운 노래를 처연하게 부르던 그 날, 소년 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아청의 손을 놓지 않겠다고. 기억의 접점마다 드러난 아청의 속 깊은 배려를, 우는 그녀 마음 역시 자신과 같다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개경으로 향하는 배에 아청은 없었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 그 많던 고음의 유품까지 통째로 들고 아청은 어디로 숨어든 걸까? 아청이 좌에게 갔을 리 없다며 도리질 쳤지만, 우는 알았다. 좌와 우, 그리고 아청이 스무 해 넘도록 견고하게 쌓아올린 시간의 탑은 이제 산산이 깨어졌다. 복원되지 못할 우정,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아름다운 시절. 그러므로 더욱 아청을 놓쳐서는 아니 될 일이었다. 삼별초 동료들과 등 돌리면서까지 이 길을 택한 까닭은, 오로지 아청과 더불어 사랑하고 살아가기 위함이었다. 어쩌면 다시 만나게 되는 날, 가장 좋았던 벗 좌와 양보 없는 결전을 벌여야만 하리라. 힘과 힘, 재능과 재능, 전략과 전략이 맞서는 목숨 건 혈투를 피할 수 없으리라.
‘전쟁이 지독할수록 평화가 간절한 법이다.
평화의 산과 바다를 노래하는 마음에 피가 서려 있음을 이지 말아야 한다.’
평화와 안녕은 아득하게 멀었지만 땅 위에서 목숨 부지하는 이들은 언젠가 맞이할 꿈결 같은 날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며 소망했다. 두고 온 고향 산천에 다시 깃드는 노래, 떠나간 사랑을 그리는 노래, 영원을 기원하는 노래, 빼앗긴 나라 백성으로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 노래, 이별 없는 궁극의 사랑을 맹세하는 노래…. 고단한 나날을 견디고 황폐해지기 쉬운 마음을 다독이는 방편이기도 했다.
이제 많은 백성은 제국에 머리 조아린 왕과 대신들을 따르는 대신 남쪽으로 가는 삼별초의 행렬에 동참했다. 그들을 가득 실은 배의 수가 천여 척에 달했다. 1270년 6월 초, 강화경을 떠나 거센 물결 위에 위태롭게 내던져진 사람들을 위무하듯 한 줄기 노래가 울려퍼졌다. 높고 깊고 따듯한 목소리. 방상의 으뜸 가인 아청이 부르는 새로운 희망의 출정가였다.
선유 장편소설 《가시리》, 과거와 현재가 만나 변주하는 또 다른 사랑노래
소설은 아청이 부르는 별곡을 배음으로 하여 그때 그들이 목숨 걸고 지켜낸 가치와 욕망, 염원과 상실을 단단하고 품격 있는 문장으로 되살려낸다. 강화를 떠나 안면소(안면도)와 진도를 거쳐 제주로 깃들기까지, 위험천만한 전투와 고난의 현장을 감싸 안던 아청의 노래는 남녀노소 모두의 가슴에 파고들어 한 사람 한 사람, 그들 생의 의미를 새로이 환기시키는 촉매제였다. 그리고…, 양극단의 무리 맨 앞에는 아청의 오랜 벗 좌와 우가 서 있었다.
바위처럼 단단하고 나무처럼 싱싱한 꿈을 지녔으되 사랑을 잃고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딛기 어려웠던 청춘들. 엇갈리고 부딪히고 피 흘리면서도 정직하게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낸 그들의 이야기는 선유 장편소설 《가시리》로 다시 태어나 오래도록 잊히지 않을 또 다른 사랑노래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