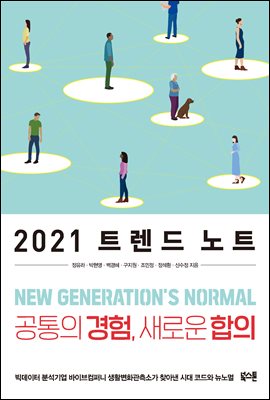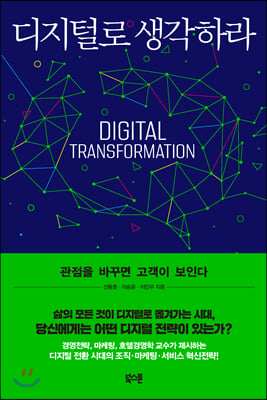꽈배기의 멋
- 저자
- 최민석
- 출판사
- 북스톤
- 출판일
- 2018-08-02
- 등록일
- 2018-12-13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매일 쓰는 작가’ 최민석,
그저 그런 것들의 멋을 논하다
최민석이 돌아왔다. 현란한 ‘구라’로 열혈팬을 낳고, 에세이 《베를린 일기》로 ‘국제호구’라는 별칭을 얻은 그가 이번에 두 권의 에세이집 《꽈배기의 맛》과 《꽈배기의 멋》을 내놓았다. 읽던 자리 아무데서나 쿡쿡거리거나 빵 터지게 하는 그만의 유머가 이번에도 빛을 발한다.
1편 《꽈배기의 맛》에서 이제 막 발을 내딛는 작가의 열기와 다짐이 읽힌다면, 2편 《꽈배기의 멋》에서는 어느덧 등단 7년차를 맞은 작가로서의 일상이 묻어난다. 이상한 손님들만 잔뜩 모인 서점 사인회, 의문의 사은품이 답지한 북 콘서트, 가까스로 지켜온 존엄을 훼손당한 치욕의 인터뷰… 물론 그렇다 해서 최민석의 글이 세월 따라 전혀 달라진 것은 아니다. 종종 상상을 넘어 망상으로 치닫고, 언제 웃음이 터질지 알 수 없어 조마조마해지는 그만의 글쓰기는 여전하다. 다만 여기에 세월과 함께 쌓인 개인의 성찰과 작가적 수련이 더해져 유머의 무게감이 느껴진다.
그의 글이 지향하는 바는 하나, 즐겁게 살기 위해 쓰는 것이다. 다만 혼자만 즐거우면 외로우니 함께 즐거워지는 글을 쓰겠다는 마음으로 또다시 매주 한 편의 글을 쓰기 시작했다. 《꽈배기의 멋》은 작가로서 최민석이 나이 들고 성장하고 회의하고 실패하며 만들어낸 기록들이다. 웃기지만 만만찮고 무거울 때조차 재미있는 특유의 문체와 함께.
갈피갈피 들출수록 터져나는 일상의 유머
갈피갈피 들출수록 깊어지는 인생의 의미
2010년 〈시티투어버스를 탈취하라〉로 창비신인소설상을 받으며 등단한 최민석 작가는, 2012년 《능력자》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하며 소설가로서 자신의 능력을 입증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한다. 자신은 에세이를 쓰기 위해 소설가가 되었다고.
그만큼 각별한 애정으로 쓰는 자신의 에세이를 그는 ‘꽈배기 같은 글’이라고 말한다. 얼핏 보기에 아무렇게나 막 쓴 것 같은 글, 더러는 ‘나도 이만큼은 쓰겠다’는 승부욕(?)을 부르는 그의 ‘B급 문학’을 상징하는 음식이 있다면 단연 꽈배기라는 것. 대단한 빵이 아니고 호텔 제과점에 그럴싸하게 진열되지도 않는 만만한 음식이지만 실상 만들어보려면 만만치 않은 음식. 한번 먹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영양소나 건강 따위 따지지 않고 눈에 띄면 ‘음. 꽈배기군’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먹게 되는 음식.
이처럼 그의 글은 부담 없이 재미있고 만만하지만, 그 안에는 결코 만만하지 않은 삶에 대한 관조가 숨어 있다. 밀가루 반죽을 죽죽 늘여 이어붙이고 배배 꼬아 만든 꽈배기처럼, 도대체 글감이 될 것 같지 않은 소재를 특유의 묘사와 유머로 늘이고 이어붙이고 뒤틀며 반전의 느낌표를 찍게 한다. 얇게 포를 뜨듯 일상의 갈피갈피를 들춰가며 기어코 웃음을 주고, 그 안에서 삶의 의미를 음미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최민석 에세이의 맛이자, 멋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