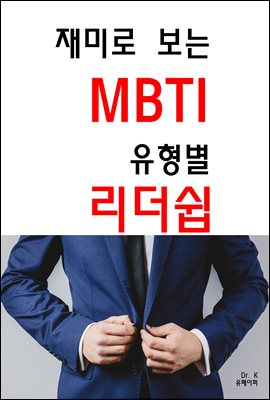상세정보

무제
- 저자
- 임윤문
- 출판사
- 유페이퍼
- 출판일
- 2022-03-15
- 등록일
- 2023-02-1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0
- 공급사
- 북큐브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공포라고 하는 소재는 사실 흔하다. 하지만 그런 흔한 공포라는 소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다루는 방법에 있다고 생각한다. 추악함이나 역겨움 혹은 그저 잔혹한 방법으로 공포를 자아내는 것은 낮은 수라고 볼 수 있다. 그 상황이 주는 섬뜻한 표현을 통해 심리적으로 극한의 공포를 자아내는 방법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솔직히 이 이야기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신병동을 배경으로 한 로맨틱 코미디를 예상하고 집필에 들어갔다. 그런데.......도입부의 끝에서 이 배경이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어울린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통찰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고서는 장르를 급하게 공포 쪽으로 돌렸다고 이야기 한다면 독자들의 김이 샐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그 방향전환은 수긍이 가고 조금 설득력을 가진 이야기전개를 가능하게 하였다. 환자들이 주인공이다 보니 그 이상심리를 묘사하기 위해 화자의 나레이션과 인물간의 대화, 혹은 생각하는 혼잣말이 어떤 구분 없이 혼재하는 것을 두고 처음대하는 독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런 표현방식, 즉 이상심리가 가지는 자아와 타아의 혼선이 꼭 필요했다고 말해주고 싶다.
공포로맨스가 있다면 이 작품을 설명하기에 적합한 장르일 거라고 생각해본다. 장르소설이 주는 재미와 아울러 표현방식의 신선함이 독자 분들에게 어필했으면 하고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