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산문
- 저자
- 강경애 저
- 출판사
- SENAYA
- 출판일
- 2013-04-11
- 등록일
- 2016-11-14
- 파일포맷
- EPUB
- 파일크기
- 182KB
- 공급사
- YES24
- 지원기기
- PC PHONE TABLET 웹뷰어 프로그램 수동설치 뷰어프로그램 설치 안내
책소개
아직도 그 사나이는 허리에 바를 동인 채 돌팔매질을 하고 있을까? 고향에 계신 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또 어머니에게서 온 편지를 읽고 난 뒷면 무뚝 이렇게 생각되는 것이 일종의 나의 버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에 지질려 뻘겋게 흐르던 피가 내 눈에 가시같이 들어박힐 때면 나는 머리를 흔들어 그 기억을 헤쳐 버리려고 몇 번이나 애를 썼지만 웬일인지 이태를 맞는 오늘까지 점점 더 그 핏빛이 선명해질 뿐입니다. 검실검실한 큰 눈에 올챙이같이 머리만 퍼진 코를 가진 사나이 그래서 양미간이 턱없이 죽었음인지 우직해도 보이고 어찌보면 소름이 끼치게 무섭던 그 사나이 그는 우금까지 바를 동인 채 돌팔매질을 하는 것같고 그러한 양을 나는 언제나 다시 만날 듯하여 소름이 끼치곤 하였습니다. 근년에 내 신경이 좀 과민해진 데서 이러한지는 몰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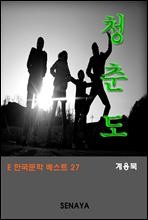







![[오디오북] 한국대표중단편문학 - 원고료 이백원](http://library.tsu.ac.kr:8084/FxLibrary/repository/ebk0/bookimg/150/1504/150400963.jpg)
![[오디오북] 한국대표중단편문학 - 동정](http://library.tsu.ac.kr:8084/FxLibrary/repository/ebk0/bookimg/150/1504/1504009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