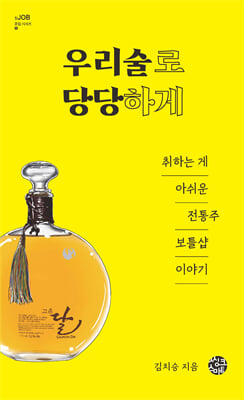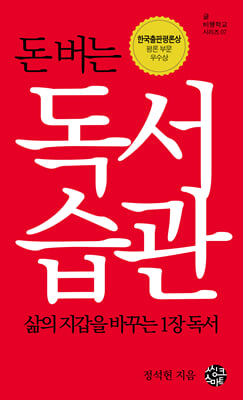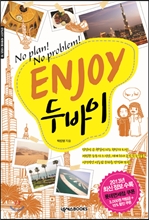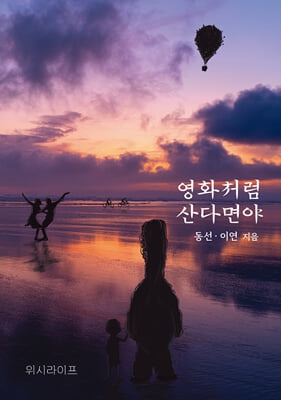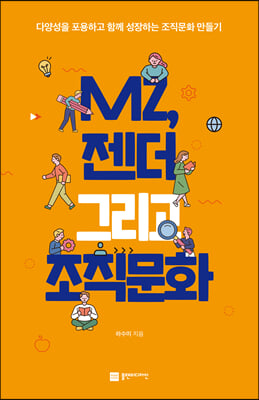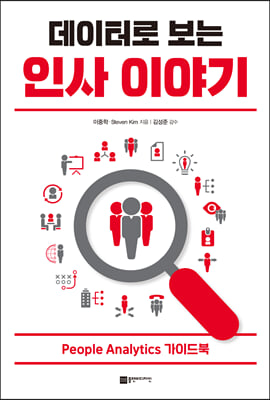책소개
마흔이면 뭐라도 될 줄 알았다는 착각 자유로운 춤꾼의 실크로드 방황여행.
<그래서 실크로드〉는 읽는 맛이 가득한 여행 에세이다. 동시에 누구나 한 번쯤 느끼는 삶의 막막함을 파고드는 산문집이기도 하다. 저자 박진영은 여행 작가도 아니고, 요즘 유행하는 여행 유튜버도 아니다. 저자는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무용가로 활동해온, 자칭 자유로운 춤꾼이다. 그래서 이 책은 더욱 매력적이다. 저자의 여행은 세련되지도, 능숙하지도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여정이었다. 마치 우리가 당장 내일도 모르고 하루하루 인생을 살아가듯 말이다. 인생에서 가장 에너지 넘치는 2-30대를 오롯이 무용에 쏟아 부은 저자는 ‘마흔’이란 벽에 부딪히고 나서야 ‘마흔이면 뭐라도 될 줄 알았다’는 생각이 ‘착각’임을 깨달았다 고백한다. 그 충격과 허탈함에 어디로든 떠나고 싶었고, 가능한 멀고 낯선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래서 목적 없이 떠난 곳이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였다. 실크로드를 마주하며 그녀가 애타게 찾았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행은 늘 새롭다. 새로운 곳에서 발견하는 나는 늘 놀랍다. 이것이 바로 여행의 심오함이 아닐까. 마흔이라는 막막함에 부딪혀 훌쩍 떠난 실크로드에서 저자는 과연 자신의 춤을 발견했을까? 그리고 그 춤이 어떤 의미였는지, 춤에 불태운 그 시간이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의 나를 만들었는지 깨달았을까? 〈그래서 실크로드〉는 춤추듯 살고 싶은 사람들, 답답한 삶의 테두리를 벗어나 진정한 삶을 느껴보고 싶은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책이다. 저자와 함께 떠나고 여행하고 춤춰보기를
저자소개
자유로운 춤꾼
공간 [움직이기] 대표
진실
어릴 적부터 가수들의 춤을 따라하던 나는 결국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는,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마주했다.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뒤늦게 무용의 길을 선택했다. 부모님 몰래 무용입시를 준비해서 단국대 무용과에 들어갔고, 숙명여대 대학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했다. 무용수로 공연활동을 시작하였다. 기준과 틀에 잘 맞아 떨어지기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점점 집착과 강박에 시달렸다. 남의 길을 찾아 메뚜기처럼 펄쩍펄쩍 뛰어다녔고, 앵무새처럼 로봇처럼 열심히 따라하기를 수련했다. 긴 시간동안 바깥만 바라보며 춤췄다. 바깥에 있는 줄 알고. 그러나 이제는 진실을 안다. 자유도 고유도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진실을. 그렇게 춤도 삶도 진실해져 간다.
고유
2010년 트러스트 현대무용단을 시작으로 2013년 호주단체 Stalker theatre와 작업하였다. 2014년 솔로 안무 [모범인간?], 2015년 프랑스 서커스 연수 및 솔로 안무 작업을 했다, 2016년 프랑스단체 Cie Osmosis와, 2017년 영국단체 Far from the norm과 작업을 했다. 좋아서, 잘하고 싶어서, 이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달렸다. 그러던 중, 2018년 한 지점에서 쥐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놓게 되었다. 더 이상 남의 기준과 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도, 춤도, 공연도 다 싫었다. 그렇게 차츰 무용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선생의 일을 충실히 해오던 마흔 살 어느 날, 문득 나이만 먹고 생계형 무용인이 된 내 모습을 보았다. 나는 그동안 대체 뭘 한걸까. 우즈베키스탄으로 떠났다. 그리고 남의 길 따라가기를 완전히 그만두었다. 나의 길을 가고, 나만의 고유하고 진실한 몸짓을 하고 싶었다. 2023년 그렇게 [움직이기]가 탄생했다.
자유
자유롭게 춤추고 싶어서 무용을 했다. 그러나 마흔 살의 나는 얽어매어진 생계형 무용인이었다. 그때 떠난 우즈베키스탄 여행은 현실의 속박을 떠나 자유를 향한 것이었다, 어쩌면 그곳엔 자유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자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다. 외부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뚜렷한 이상적 실체로써 자유를 생각했기에. 내가 찾던 자유는 허상의 개념일 뿐이었다. 어쩌면 나는 이미 자유로운 속에서 자유를 찾고 있었던 것인지도 몰랐다.